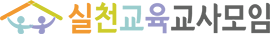돌봄교실 업무 6년. 돌봄교실 속 아이들의 모습을 전달하기에 아주 적합한, 필자의 이색적인 경력이다. 늘봄은 돌봄의 확대판이라고 해도 무방하니, 필자가 관찰한 것은 늘봄교실의 맨 얼굴일 것이다.
누구를 위한 돌봄(늘봄)인가, 그 생각의 시작점은 아이들의 표정이었다.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 가사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많은 이가 그 통찰력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 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들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의식도 못한 채로 그냥 숨만 쉬고 있는걸.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진 이 말,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해’”
1996년에 발매된 곡인데, 현재 아이들의 상황을 묘사하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네모난 돌봄(늘봄)교실 문을 열어보자.
학교 수업 혹은 방과후 수업까지 마치고 돌봄교실에 도착한 아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다. (교사가 수업 준비와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체력을 모조리 빼앗기기에 충분히 과중한 돌봄교실 프로그램 강사 선발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돌봄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의 교육 전문성 문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다.) 옛날보다 좀 더 동글동글해진 책상과 알록달록한 교실 벽은 좀 나아졌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곳에서도 아이들은 숨 돌릴 틈이 없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각자의 스케줄에 맞춰 돌봄교실을 오고 가고 간식을 먹기에, 프로그램 중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돌봄교실에 놀거리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수요 조사를 하긴 했던 것 같은데, 막상 보니 참여하고 싶지 않은 활동도 많다. 정해진 프로그램과 정해진 시간 내에 자신의 역할을 해야하는 전담사와 강사는 아이들이 정서적 유대를 느끼고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오늘 교실에서 왜 속상했는지, 무엇 때문에 뿌듯했는지 재잘대며 말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자전거도 타고 마음껏 뛰어놀고 싶지만 모두 돌봄교실’ 퇴근’ 이후에나 꿈꿔볼 일이다. 이후에 학원이 없거나 부모님이 허락해준다면 말이다. 저녁까지 돌봄교실에서 해결해야 한다면 상황은 더 끔찍하다. 가족이 오손도손 밥먹는 모습은 교과서에서나 보는 그림일 뿐이다. 얼른 집에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자신을 돌봐줄 이가 없어 그 시간 동안 이곳에 맡겨졌다는 것을 아이들은 안다. 그래서 불평할 수도 없다. 온종일 목빠지게 기다린 아빠, 엄마는 피곤하다. ‘얼른 숙제하고 씻고 자라’는 말을 들으며 하루를 끝내지 않으면 다행이다. 함께 과일을 깎아 먹고, 눈 맞추고 내 마음을 이야기할 시간이 있다면, 잠시라도 뒹굴거리며 상상의 나래를 펼칠 시간이 있다면 그 날은 좀 괜찮은 날이다. 내일 또 네모난 곳에 매여 있어야하지만 견딜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 모두는 칼퇴를 기다리는 기분, 칼퇴할 때의 그 날아갈 것 같은 발걸음, 그 느낌을 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칼퇴하고 싶다! 집에 돌아오면 답답한 옷부터 풀어헤친다. 편안한 자세로,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 내 소중한 사람과 이야기 나누며 따뜻함을 느끼고 싶지 않은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지내고 싶은 것처럼, 아이들도 그러고 싶다.
‘돌봄교실에는 친구들도 있고, 재밌는 것도 배우니, 즐겁게 지내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싶은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찾아오는 그 순간, 돌봄교실을 나서는 그 순간, 진정으로 환해지는 아이들의 얼굴을 본다면, 그런 말은 쉽사리 꺼낼 수 없을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배울 것이, 가정에서는 가정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 학교에서 배움을 마치고 진정 필요한 것은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깊은 교감을 나눌 곳, 자유롭게 편히 쉴 곳, 가정이다. 지금 당장 각 가정에서 아이를 봐줄 보육 기관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 어른들은, 이 보육정책이,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란다.
우리 사회의 방향성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아이를 대신 길러주는 보육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안된다.
부모를 가정으로, 아이를 가정으로.
실천아레나는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가는 뜨겁고 건강한 논쟁의 장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메일을 보내주세요. koreateacher333@gmail.com